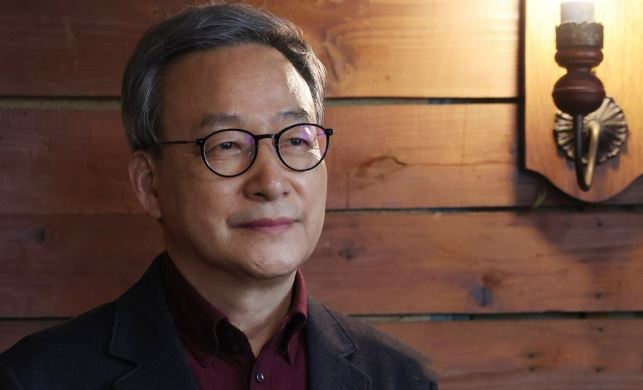
정호승 시인 [자료사진=연합뉴스]
"삶에서 영원한 주제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죽음이에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노년이 되니까 이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하나둘씩 들어내고 비워내면서요."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정호승(72),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픔'과 '외로움'의 시인답게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명확했다. "일흔이 넘으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너털웃음을 보이면서 "우리는 항상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고 결국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올해 등단 50주년 기념 신작 시집 '슬픔이 택배로 왔다'(창비) 출간을 맞아 최근 전화로 만난 시인은 "이번 시집을 내기 위해 한 해를 살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 좀 더 시를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됐다. 죽을 때까지 시를 써야 시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등단한 시인은 어느 문학평론가가 쓴 '문학은 결사적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30년 넘게 책상 앞에 붙여놨다. 시 쓰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구를 곱씹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소설을 쓰려고 했던 몇 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시를 쓰고 시집을 냈다. 그렇게 세상에 내놓은 시가 1천100편이 넘는다.
이번 시집에는 유독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죽음을 찬양하는 건 아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한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안에 삶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시인은 "사랑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좀 더 본격화됐다"고 고백했다.
소설가가 소설의 첫 문장을 고민하듯 시인도 시집의 첫 작품, 그 작품의 첫 구절을 고민한다. "내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시 '낙과' 일부). 여기에서 책임은 햇빛, 바람, 인간의 눈빛 등 타자에 대한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떨어진다는 것은 곧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시인이 115편의 시 가운데 '떨어짐'(落)의 의미를 제목에 담은 작품만 6편이다. 낙과(落果), 낙곡(落穀), 낙수(落水), 낙석(落石), 낙심(落心), 낙법(落法) 등이다. 특히 '낙과'는 시집의 표제가 된 시 '택배'와 함께 시인이 가장 애착을 갖는 두 작품이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시 '택배' 일부). 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택배로 온 슬픔의 내용물은 영원한 이별, 즉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한방울 눈물이 남을 때까지/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시 '택배' 일부). 생명을 줬다가 생명을 거둬들이는 절대자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시 안에서 묻어난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이 택배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무조건 수령해야 한다.
그는 2013년 아버지를, 2019년 어머니를 각각 떠나보냈다. 시집에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더 다정하게 다가가겠다는 다짐(시 '아버지의 기저귀'), 작업실에 다녀온 사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회한(시 '어머니에 대한 후회'), 나를 꾸짖을 어머니가 없음을 깨닫고 느끼는 서러움(시 '회초리꽃') 등이 담겼다.
시인은 "부모님은 죽음의 과정이 이렇다는 걸 가르치고 가셨다"며 "나도 언젠가는 그런 결과로서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 누구든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장관, 교수, 사장 등처럼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이름 뒤에 전(前) 자가 붙지 않는 게 시인이다. 시인에게는 그 자체로 현재성이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더 쓰고 싶은 시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시작(詩作)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그가 유년기를 보낸 대구 수성구 범어천 근처에 '정호승 문학관'이 들어선다. 시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라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에는 문학관에 전시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주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는 학창 시절 습작 노트와 문인들과 찍은 사진 등 각종 자료가 꽤 많다고 했다.
"제가 50년간 열심히 시를 써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시를 버린 적이 있었는데, 시는 저를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시에 대해 아주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제 시를 사랑해준 독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시 쓰기에만 천착해온 자신에게도 감사해요."